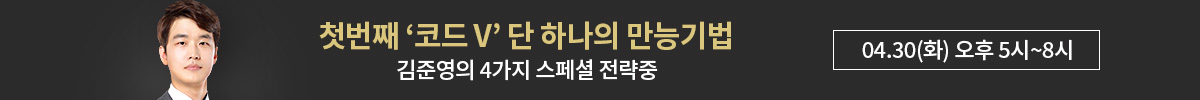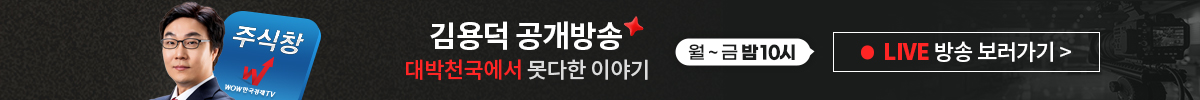새하얀 캔버스가 전시장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다. 본격적인 드로잉에 앞서 물감의 발색을 돕기 위한 ‘밑칠 작업’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쯤, 캔버스 가장자리에 눈길이 닿는다. 빨강과 노랑, 초록, 파랑 네 가지 색상의 물감으로 수없이 붓질을 덧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새하얀 캔버스가 전시장 벽에 덩그러니 걸려 있다. 본격적인 드로잉에 앞서 물감의 발색을 돕기 위한 ‘밑칠 작업’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쯤, 캔버스 가장자리에 눈길이 닿는다. 빨강과 노랑, 초록, 파랑 네 가지 색상의 물감으로 수없이 붓질을 덧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전원근 작가의 작품 ‘무제’(2023·사진)는 흰색인 듯 흰색이 아니다. 새하얀 수건보다는 오래 쓴 행주 같은 세월감이 느껴진다.
서울 삼청동 초이앤초이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원근의 개인전에선 이처럼 여러 겹의 색을 입히고 지워내는 과정을 반복해 그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나의 색을 사용한 그림부터 체크무늬, 원형 패턴 등 형태는 여러 갈래다. 전 작가는 “오랜 시간 축적하고 덜어내는 과정 자체가 예술의 일부”라고 말했다.
올해로 25년 차 작가인 전원근은 27세에 독일 뒤셀도르프로 넘어갔다. 주변에 위로를 건네겠다는 마음으로 미술을 시작하며 미니멀리즘에 뛰어들었다. 몇 차례의 거친 붓질만으로 물감의 물성을 강조하던 당시 유럽식 모노크롬(한 가지 색을 사용한 그림)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작품이 풍기는 특유의 긴장감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옅은 물감을 수백 번 덧칠하고 덜어내는 방식으로 색의 경계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지우는 작업에 몰두했다.
전시의 제목은 ‘식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로, 공들여 가꿔야 하는 그의 작품 세계를 상징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평범하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을 물에 묽게 풀어 넓적한 붓으로 칠한 게 전부다. “저의 작품들은 화려한 메시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화분에 물을 주듯 캔버스에 물감을 더하는 과정을 반복할 뿐이죠.”
전시장 벽면에는 작품 테마별로 작가가 직접 지은 문구를 적어뒀다. 관객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한 작가의 새로운 시도다. “식물처럼 고요해 보이는 제 작품들도 왜 붓을 이렇게 썼는지, 왜 이런 기하학적 모양을 썼는지 등 질문을 던지며 감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는 2월 24일까지.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관련뉴스